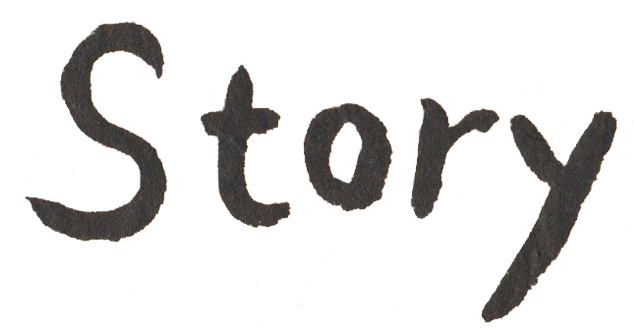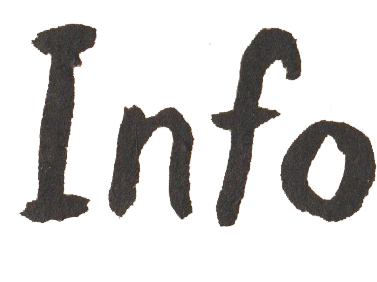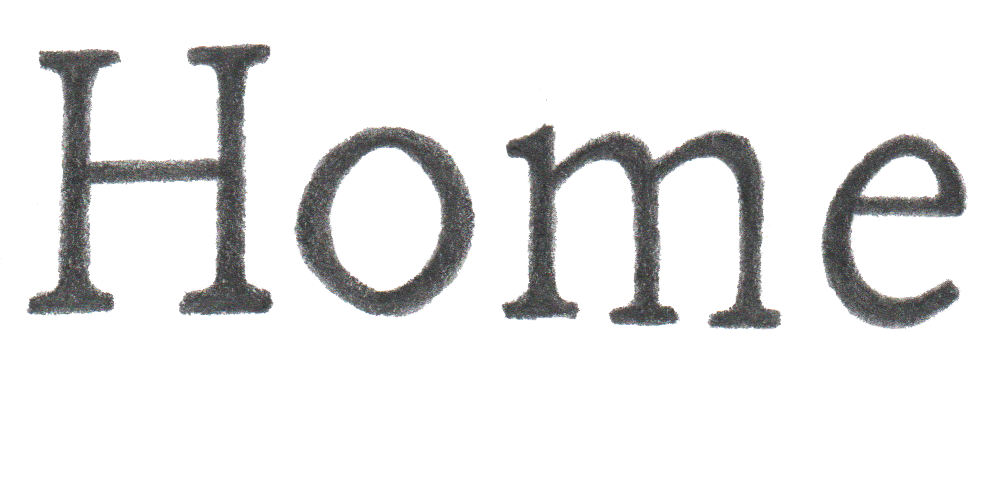나는 음양오행을 통하여 연결과 순환을 표현한다. 세계의 모든 것은 연결되어 있고 원운동을 하며 끝이 다시 시작으로 이어지며 순환한다. 우리는 지구생태계와 연결되어 있으며 지구생태계는 지구의 운행과 태양에너지에 의존한다. 지구의 운행과 태양에너지는 우주의 팽창과 수축의 리듬속에 놓여있다. 또한 우주가 팽창과 수축을 하듯 우리는 들숨과 날숨을 쉬어 살아간다.
세계가 연결되어 순환한다는 것을 이해하지 못했을때 나는 세계를 혼란스럽고 우연하고 마구잡이라고 여겼다. 세계가 이러하니 진리라는 것은 없고 따라서 믿을 수 있는 것도 붙잡을 수 있는 것도 없었다. 그러한 상태에서는 순간적인 감각만이, 순간적인 감정만이 진실이라고 여겨졌다. 초기 유화작업들은 이러한 상태에서 그려졌다. 그래서 즉흥적인 감각과 감정의 표현이 중심이 되는 표현주의풍의 작업으로 나타났다. 작업 전반을 아우르는 주제나 이야기는 없었다. 그것을 중요시 생각하지 않았고 오히려 등한시 하였다. 왜냐하면 세계가 어차피 우연하고 마구잡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세계에서 일관된 이야기를 한다는 것은 거짓이라고 생각했다. 그냥 오늘은 오늘 느낀 것을, 내일은 내일 느낀 것을 그렸다. 그것이 서로 모순되어도 개의치 않았다. 오늘 그리고서, 내일은 그 위로 오늘과는 아무 관련없는 이미지를 그려넣었다.
그러던 중 음양오행을 접하면서 세계를 바로보는 관점에 변화가 생겼고 작업에 변화가 생겼다.
<음양오행>
‘음양’은 서로 대척점에 있는 상반된 것이 사실은 연결되어 있고 보완되며 서로 오고가기를 반복하며 순환하는 것을 뜻한다.
낮과 밤, 밀물과 썰물, 활동과 휴식 등이 그러하다.
‘오행’은 목화토금수 다섯가지 속성이 상생과 상극의 관계속에서 움직이며 변화하는 모습이다.
사계절의 변화, 동서남북, 생장수장 등이 그러하다.
불변하는 절대적 실체가 아닌 관계속에서 어떤 상황에 놓이냐에 따라 의미와 작용이 달라진다.
예를 들어 위와 아래는 고정된 어느 한 지점이 아니라 기준을 어느 곳에 두느냐에 따라 달라지는 가변적인 것이다. 위가 없다면 아래가 없고 아래가 없다면 위도 없다.
봄에는 싹이 트고, 여름에는 녹음을 이루고, 가을에는 열매를 맺고, 겨울에는 활동을 멈추고 기운을 거두어 들인다. 이렇게 그 시기에 적절한 행위가 있다. 싹을 틔우는 것은 옳고 기운을 거두어 들이는 일은 그르다고 할 수 없다.
음양오행을 공부하기 이전에는 시기에 따라 상황에 따라 답이 달라지는 것에 대하여 혼란을 느끼어 마구잡이라고 생각하고 역시 진리가 없구나 생각했다. 음양오행을 공부하면서 움직이고 변화하는 모습이 세계의 속성이자 진리라는 것을 이해하게 되었다.
작업에 쓰이는 재료는 주로 재사용 재료를 사용한다. 작업에 주 재료는 나무인데 산이나 공원에 잘려져 있는 나무나 누군가 사용하다 남거나 버린 목재를 가져다 사용한다. 새 것을 쓸 때에는 되도록 천연재료나 독성이 약한 재료를 사용하려고 한다.
음양오행을 공부하며 음양오행이 지구의 자전과 공전에 의한 기후에 대한 이야기라는 것을 알게 되었고 자연스레 기후, 환경에 대한 관심으로 이어져 환경에 영향이 덜한 재료를 선호하게 되었다. 또 연결과 순환을 표현하기에 감수성의 면에서 재사용 재료, 천연재료가 잘 맞는다고 느낀다.
본격적으로 작업에 들어가면 몸의 감각, 재료의 감각 그리고 혼돈을 중요시한다.
몸의 감각을 중요시하는 건 몸의 흔적이 보이는 작업을 추구하는 것이다. 그래서 큰 덩어리를 자르는 등의 꼭 필요한 부분이 아니면 전동기기보다 수작업을 선호한다. 작업을 어느 선까지 다듬어야 할지 고민하는데 대체로 너무 다듬지 않도록 한다. 너무 다듬어서 평평해지면 손이 오고 간 흔적이 흐려지기 때문이다.
재료의 감각을 중요시하는 건 재료를 가공할 때 원 재료의 특징이 살 수 있도록 가공의 정도를 조절하는 것이다. 원재료의 형태가 가진 매력을 그대로 살려서 작업하려고 한다. 나무에 채색할 때는 나뭇결을 다 덮지 않도록 농도를 조절한다.
혼돈은 주제, 몸, 재료 등에 지향점이 있으나 때때로 그런 것들을 잊어버리고 그냥 되는대로 진행하는 것이다. 무목적의 상태가 목적의 상태를 보완하여 오히려 목적을 명확하게 만들어준다고 생각한다.